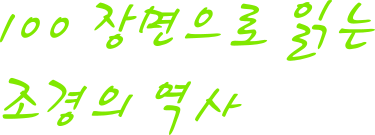그 사이 한국에 토크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아 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.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(그룹한 갤러리)이 가득 찼다. 고맙게 와 주신 독자들께 좋은 시간을 선사했어야 하는데 내내 횡설수설했다는 느낌 밖에 없다. 워낙 순발력이 없는데다가 굳이 핑계를 대자면 어머니 상을 당해 급귀국했던 터라 제정신이 아니기도 했다. 지금 돌아보니 그랬던 것 같다. 사실 질문들이 내게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다. 몸도 마음도 행사장에 있었지만 영혼은 다른 곳에 있었다. 어머니 곁에.
마지막 질문 중 하나가 그 긴 시간 어떻게 끝까지 연재를 했느냐 였던 것 같다. 답은 사실 간단했다. 시작했으니 끝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별 생각이 없었다. 사람이 미련하여 도중에 그만 둔다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다고. 한 번 걸른 적이 있다. 그때 다른 업무가 너무 많이 겹쳐서 제대로 된 원고를 쓸 수 없을 듯 하여 한 회 뒤로 미뤘다.
그러자 서울 시립대 김아연 교수가 메일을 보내 <어디 아프신 것 아닌지> 걱정해 줬는데 그때 사실 너무 고마웠다. 그때 외에도 김아연 교수가 이따금 메일을 보내 피드백을 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. 남기준 편집장이 가끔 독자들 반응을 전달해 준 것도. 아~ 읽는 사람들이 더러 있구나 싶어 고맙고 다행스러웠다.
글을 쓰다 보면 이거 누가 읽는 사람은 있나?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다. 토크와는 달리 대화 상대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쓴다. 연재를 기획한 남기준 편집장, 주필 배정한 교수, 내 원고를 담당했던 조한결 기자, 직접 피드백을 보내 독려해 준 김아연 교수와 조경작업소 울 김연금 소장. 강원대 윤영조 교수 등, 이분들과 머릿 속으로 대화하면서 썼다.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선사할 수 있을까. 이런 마음이었다.
늦게나마 북토크에 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. 다음토크 때는 제대로 수다를 펼쳐볼까 한다.